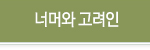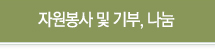3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지역 4개의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뉴스영상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2055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2046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20376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20273
<앵커 멘트>
까레이스키라고도 불리는 고려인을 아시나요?
국내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데 말과 글이 서툴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엔 자리가 모자랄 정도라고 하는데, 그 뜨거운 배움의 현장을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경기도 안산의 '땟골마을'.
야학이 열리는 지하 교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좁은 교실은 어느새 가득차, 통로까지 의자를 깔고도 자리가 모자랍니다.
밤 10시20분. 남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고려인 근로자들에겐 유일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인터뷰> 강유리(우즈베키스탄 출신) : "밤9시까지 일했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잠시 눈만 붙이는 좁은 월세방.
한자라도 더 익히려 벽에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김 나제즈다(66살, 우즈베키스탄 출신) : "그래도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고려인들이...무슨 말을 해도 똑똑히 말해야되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리고 동포와 더불어 살기위해...
우리말과 글에 대한 배움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인터뷰> 김진영 (야학 교사) :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같이 있는거죠"
150년의 유랑 생활.
그 정착의 끝이 어딜지 몰라도 고려인들에게 조국의 말과 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삶의 뿌리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