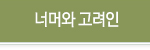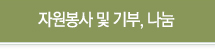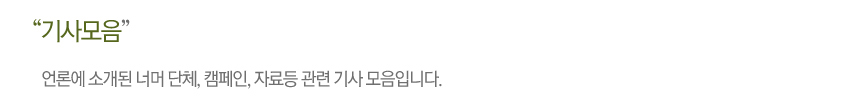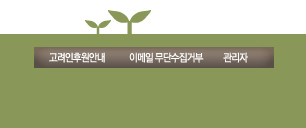고려인 이타마라씨의 가족이 12월26일 저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방식의 국수를 만들어 먹고 있다. 고려인들은 차가운 물에 간장, 식초, 설탕, 소금, 허브 같은 오크로프 등을 섞어 육수를 만든다. 양배추 무침, 김치, 계란, 오이무침, 가지 볶음, 돼지고기 볶음 등을 고명을 면 위에 올린 뒤 육수를 부어 먹는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려인 이타마라씨가 12월26일 저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방식의 국수를 만들고 있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려인 이타마라씨가 12월26일 저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방식의 국수를 만들고 있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유랑하는 삶을 상징하는 고려인의 음식, ‘국시’ 고려인 국시의 조리법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두만강 건너의 조선인들을 스탈린이 1937년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흩어놓은 뒤에도 ‘카레이스키’(고려인을 이르는 러시아말)들은 고향을 기억하려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시를 말았다. 국시는 한민족에게 고된 농사일을 견디는 새참이었고, 기쁜 일을 함께 하는 잔치음식이었다. 다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사막성 기후를 견디는 동안 뜨끈한 국물은 냉국으로 바뀌었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푸짐한 고명이 한국식 고명을 대체했다. 타마라가 국시에 즐겨 올리는 고명은 3대가 모두 좋아하는 돼지고기다. 기름을 두른 웍에 채 썬 양파와 소금, 고춧가루를 넣어 볶는다. 남쪽 사람들은 꺼리는 고수씨 가루도 넣어 향을 더한다. 쪽파와 마늘, 돼지고기를 볶고 여기에 토마토와 가지, 양배추, 오구레츠(러시아 오이)를 더한다. 달걀지단과 소면·중면을 쓰는 것은 영락없는 한국식 국수 조리법이고, 고기를 써서 기름지게 조리하는 것은 러시아 방식이다. 여기에 간장과 빙초산, 설탕으로 간한 국물을 부으면 물냉면이나 동남아시아 음식처럼 보인다. 우즈베크에선 본래 차갑게 먹는 국시지만, 안산의 시린 밤을 견디려 따뜻한 물을 섞으니 미지근한 맹탕이 되었다. 타마라 3대가 아침으로 자주 먹는 흘레프(러시아 빵)도 마찬가지다. 우즈베크에 사는 고려인들은 거칠고 심심한 맛의 러시아 빵에 한국식 고추기름과 된장을 섞은 양념장을 바른 뒤 김치나 마늘을 얹어 먹는다. 타마라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가 조선 땅에 대한 그리움을 우즈베크의 주식인 빵과 섞어서 만든 고려인들만의 식문화다. 포개어질 듯 포개어지지 않는 것들이 담긴 이들의 밥상은 우즈베크에도 러시아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타마라 3대의 정체성을 그대로 빼닮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제비나라를 그리워하며 거친 밭을 갈 때 먹었던 국시는,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서도 거친 노동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음식이다. 젓가락 대신 포크를 들고 타마라 3대는 바투 모여 앉아 후루룩, 국수를 삼켰다. 이들 가족이 하루 중 유일하게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고려인 이타마라씨가 만든 우즈베키스탄 방식의 국수.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려인들이 아침식사로 즐겨먹는 빵. 평범해 보이지만, 빵에 된장을 바르고 김치를 얹어 먹는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물림된 ‘검은 노동’의 거친 삶 이 국시 한 그릇이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포개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대물림되는 고난을 상징한다. 안젤리카는 날마다 새벽 5시50분이면 집을 나서 승합차에 오른다. 믹스커피 한 잔이 그의 잠을 깨우고 빈속을 채운다. 안산 선부동에서 안젤리카와 비슷한 고려인들을 태운 승합차는 경기도 화성의 공단에 가서 이들을 쏟아낸다. 이곳의 향수병 공장에서 안젤리카는 아침 7시30분부터 12시간을 꼭 맞춰 일하고 다시 승합차에 오른다. 2주 간격으로 야간 교대근무까지 하고, 200만원 남짓 번다. 할머니들의 고향이라는 한국에 와서 5년 가까이 안젤리카는 주변 주경을 해본 일이 없다. 딸이 일하는 공장에 한 번도 간 적 없어도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일하고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타마라도 10년 전 한국에 온 뒤 식당 일과 아파트 청소, 모텔 청소 등과 같은 ‘검은 노동’을 전전했다. 러시아에서는 몸을 쓰는 기피(3D) 업종을 그렇게 이른다. 한국에서 고려인들은 중국 동포들이 비켜난 가장 험한 일을 맡는다. 동포이긴 하나 말이 통하지 않아서다. 1991년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자국민 정책을 쓰며 고려인에게도 우즈베크어 쓰기를 강요했다. 30대까지 고려말과 러시아말을 다 쓰던 타마라 같은 3세대 이상 고려인들은 어디에도 일할 곳이 없었다. 일굴 땅을 찾아 강을 건넜던 고려인들이 일을 찾아 제비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한 까닭이다. “우즈베크에 있을 때부터 난 여기, (고향) 한국이지. ‘거기 나라(우즈베크)는 우리나라가 아니란다.’ 나는 그렇게 배웠소.” 태어난 곳도 아니고, 와본 적도 없는 한국이지만 타마라의 굳은 신념이었다. 그러나 50대가 돼서야 돌아온 고향은,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고려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모텔이나 목욕탕 등에서 나오는 수건과 찜질복을 세탁하는 대규모 세탁소 일을 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세탁소에서 하루 꼬박 12시간 일하면 100만원가량의 월급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자꾸 타마라를 속였다. 월 100만원을 준다던 세탁소 사장은 “다음에 더 준다”는 말을 거듭하며 10만~20만원씩 푼돈만 쥐여주고 “다음데 더 줄게”라는 말만 반복했다. “월급 아이 주면 일 아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사장은 듣지 않았다. 타마라가 한국말도, 한국의 법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사장님 밥 먹는 데까지 쫓아가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싸우면서 결국 그 돈 다 받아가지고 나왔소.” 억척스럽게 살아내야 했던 타마라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선 그러지 못했다. 타마라를 따라 몇 달 뒤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고려인 남편은 일자리를 구한 지 사흘 만에 ‘급성 심정지’로 숨졌다. 지병도 없던 남편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로 죽은 건지, 타마라는 알지 못한다. “그저 앉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모르지. 경찰이 그렇게 이야길 하이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한국말을 좀 더 잘했다면, 한국에 대해 좀 더 잘 알았다면, 남편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지 모른다. 9년 전과 달리 타마라는 이제 ‘심정지’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이미 남편은 재로 변한 지 오래다. 엄마 타마라처럼 우즈베크 말을 하지 못해 주변인이 된 안젤리카 역시 차라리 러시아 말을 쓸 수 있는 러시아에 건너가 살기로 했었다. 그런데 2014~15년께 러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당 보조로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다. 평생 러시아 말만 써온 안젤리카는 2015년 한국에 와서 채 한국말을 익힐 새도 없이 자동차 부품 공장 일에 뛰어들었다.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서 종일 일을 해도 월급은 고작 120만원. 안젤리카는 엄마 타마라가 그랬던 것처럼, 고려인 인력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안젤리카도 고려인 남편이 2011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자주 속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사 먹은 게 화근이 됐다. 남편은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갔고, 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선 “이미 늦었다”고 했다. 남편은 수술 뒤 6개월을 더 살고 숨을 거뒀다.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았다면 남편의 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던 안젤리카는 아빠를 잃은 세살 딸 베로니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왕이면 ‘엄마가 있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고 4년 뒤 안산으로 스며들었다.

김베로니카(왼쪽)가 12월26일 저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거리에서 퇴근하는 어머니 남안젤리카를 반갑게 안고 있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려인 이타마라씨 가족이 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고려인 마을 모습. 거리에는 러시아어로 쓰여진 상가들이 많이 보인다. 안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려인 마을 ‘땟골’에서 피워내는 꿈 타마라 3대와 같은 고려인들이 안산 선부동 고려인 마을 ‘땟골’엔 넘쳐났다. 볏과의 다년초 ‘띠’가 많이 자생해 ‘띠골’(땟골)이라 했던 땟골은 이주노동자들이 앞서 터 잡은 안산 단원동 일대보다 변두리라 집값이 쌌다. 한국말을 못하는 이들도 땟골에선 고려인 지원단체나 인력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땟골 거리에는 러시아 식재료를 파는 슈퍼마켓도 여럿 있다. 그곳은 한국이지만 러시아처럼 보이는데, 사는 이들은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고려인들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고려인은 8만3천여명(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 통계월보>)으로 추정된다. 땟골은 150여년을 유랑한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이곳에서 타마라 3대도 마침내 뿌리내리는 삶을 꿈꾼다. 베로니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 ‘북짜이’(고려인식 된장찌개)나 ‘시락장국’(시래기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누구도 ‘카레이스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삶이다. 땟골에서 한국말을 배운 베로니카는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할머니가 잊어가고, 엄마는 배운 적도 없는 제비나라 말을 청산유수로 읊는다. 타마라와 안젤리카가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이다. “우즈베크 가고 싶다는 생각 없소. 베로니카가 글 읽어야 되지. 베로니카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 보고 싶소.” 안산/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