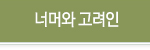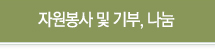다큐영화 '고려 아리랑:천산의 디바' 상영…"고려인, 고난에도 한민족 정체성 지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났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청한 하늘에는 별도 많고/ 우리네 삶에는 말도 많다"
아흔 살 노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른다. 그런데 아리랑치고는 가사도, 선율도 조금씩 다르다.
화면 속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사는 고려인인 지순옥(94) 할머니.
이역만리 타향을 떠돈 세월 탓에 모국어는 많이 잊었지만 아리랑을 부를 때만큼은 또렷이 가사를 기억해냈다.
이는 영화 '고려 아리랑:천산의 디바'의 한 장면이다. 150년 동안 중앙아시아를 떠돈 고려인의 발자취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할머니는 왜 아리랑을 품고 살아온 걸까.
김정(55) 감독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려인의 역사를 처음 듣는 순간 그들이 걸어온 삶에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면서 "고려인의 발자취를 따라 2년여 동안 중앙아시아를 누빈 끝에 영화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말대로 고려인의 삶에는 근대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민족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제 강점기 가난과 핍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은 '고려인'으로 불리며 시베리아의 언 땅을 일궜고, 1937년엔 스탈린의 탄압에 떠밀려 재차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내몰려야 했다.
영화는 이들 고려인에게 정신적 구심점이 됐던 여성 예술가 2명을 주인공으로 했다. 고려인 공연단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던 이함덕(1914∼2002년)·방 타마라(74) 여사다.
"고려인은 소수민족으로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지친 하루를 끝내고 고려극장에 모여 공연을 보면서 자긍심을 지켰습니다. 다 함께 춘향전·심청전을 보고, 아리랑을 따라부르면서 시련을 이겨낼 끈끈한 동포애를 키운 거죠. 지금도 많은 고려인이 이함덕·방 타마라 선생과 함께 울고 웃던 시절을 생생하게 증언하더라고요."
고려극장은 고려인의 첫 정착지인 러시아 연해주에서 1932년 설립됐다. 고려인이 강제 이주로 황무지에 흩어져 살게 된 이후엔 대륙을 돌며 순회공연을 펼쳤다. 김 감독도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곳곳을 찾아다니며 고려극장에 얽힌 추억을 카메라에 담았다.
"처음엔 걱정이 컸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자료를 발굴해야 하나 싶어서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꼭 만나고자 했던 고려인 후손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한밤중 깜깜한 벌판에 보름달이 뜬 덕택에 조명이 없는데도 촬영에 성공한 적도 있어요. 고려인의 목소리를 국내에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나 보다 싶었죠.(웃음)"
영화의 중심에는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이 흐른다. 연해주에서 이함덕이 불렀던 아리랑은 카자흐스탄의 지순옥 할머니를 지나 2015년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정선 아리랑 축제'에서 고려인 지휘자에 의해 공연된다.
"고려인이 부르던 아리랑이 흘러 흘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고려인은 고난 속에서도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켰거든요. 지금도 4월 5일에는 한식(寒食)을 지켜 제사를 지내고, 세상을 뜨기 전에 한번은 한국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이들에겐 한국이 '역사적 조국'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조국에 전해지기를 바라죠. 저희 촬영팀도 어딜 가든 환대를 받았거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화는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으로 지난 3일 신촌 메가박스에서 첫선을 보인 데 이어 5일에도 관객과 만난다.
김 감독이 만났던 300여 명의 고려인이 이 영화를 본다면 소감이 어떨까.
"무척 기뻐하시겠죠. 근데 예술적으로도 만족스러워하실지는 모르겠네요.(웃음) 고려인들의 예술적 수준이 무척 높거든요. 역경에 굴하는 대신 유머와 활력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고려인 고유의 문화를 일궜습니다. 고려극장의 공연을 보러 소련 사람들도 몰려왔다고 해요. 지금도 카자흐스탄 국립 극장으로 인정받아 왕성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의 '천산'(天山)은 중국부터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뻗은 톈산 산맥에서 따왔다고 한다. 고려인들이 넘어가야 했던 '아리랑 고개'는 천산만큼 높았을까.